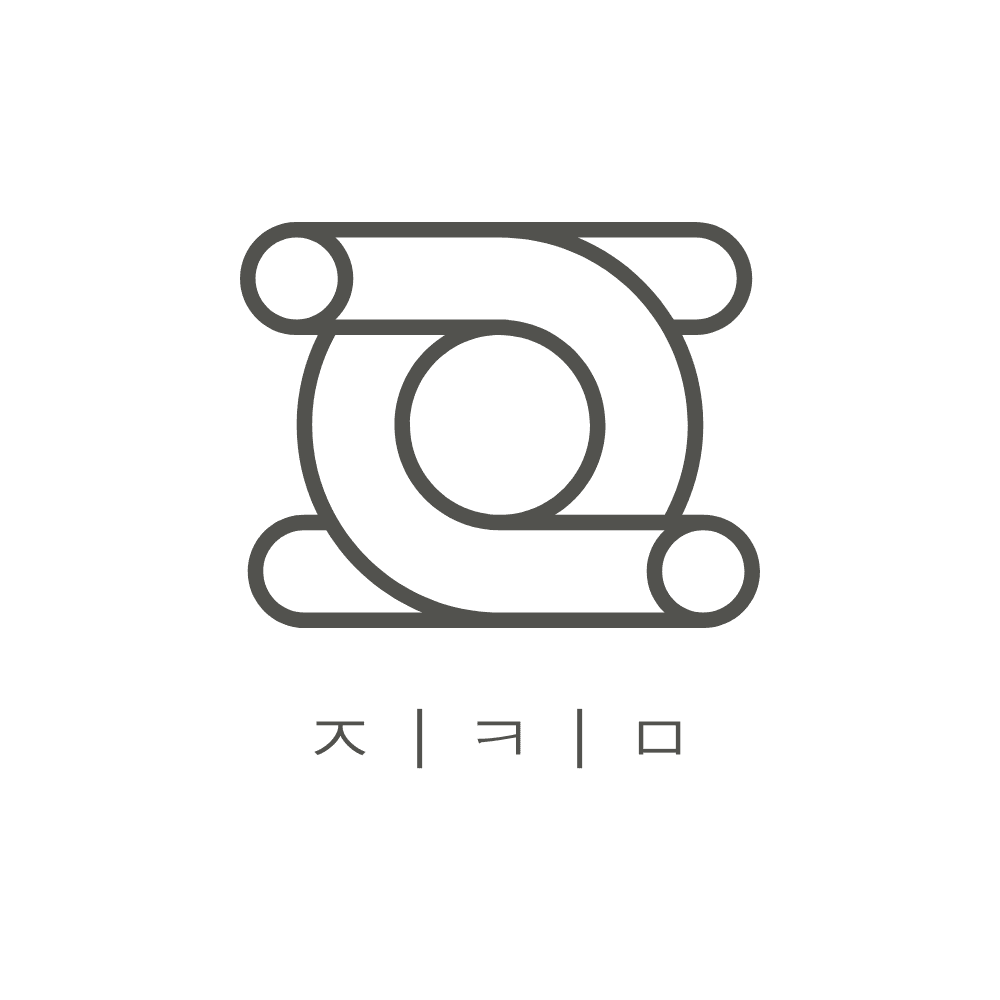** 모든 내용의 기반은 건축재료 잡지 'GAM감' 에서 발췌되었습니다.

Discovery of Flooring 다시보는 바닥재
바닥재는 건물 내외부 바닥에 까는 건축재료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크게 비닐이라 타일과 같은 인공재, 목재와 석재 같은 자연재로 나뉘는데,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십수 가지이고 실외에 쓰이는 재료까지 더하면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해진다. 바닥에 쓰인다는 점 외에 일괄된 소재나 형태가 없다. 어느 한 재료를 콕 집어 바닥재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이기 때문.

새로운 바닥재를 맞이하는 시대
'문지방을 넘다' 또는 '문턱을 넘다'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거나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된 요즘 우리 시대이다. 거실에서 방으로, 방에서 거실로, 집 안에서 집 밖으로,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장소를 옮길 때는 누구든 문지방 또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최근엔 아파트가 확산되고 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추세지만, 문지방은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장소와 장소를 구분하는 경계였다. 이 경계를 넘으면 새로운 장소가 시작된다. 여기는 욕실, 저기는 안방, 또는 거실.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각 방의 용도와 목적 그리고 사용자가 달라진다. 문지방을 넘어 처음으로 밟게 되는 바닥이 서로 다름은 물론이다.
방과 거실에는 다양한 디자인이 다양하면서도 유지관리가 쉬운 비닐 바닥재나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나무 바닥재를 주로 사용한다.

욕실의 바닥재는 대개 타일이다. 인테리어 시공 시 방에 쓰이는 바닥재의 소재는 비닐과 목재가 주를 이룬다. 물에 자주 노출되는 욕실에 타일이 쓰이는 것은 상식적.
그렇다면 방에 비닐과 목재가 주로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닐 바닥재는 시공이 간단하고 제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목재 바닥재는 나무 고유의 문양이 주는 아름다움과 따스한 질감이 있다. 하지만 타일 바닥재가 저렴하고, 시공이 간단하다고 해도 방의 바닥재로 화장실에 사용하는 타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일부에 불과하다. 방과 타일의 동거, 어딘지 어색하다.
공간에 맞춰 바닥재가 정해진다기보다 바닥재에 따라 공간이 변화하고 우리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같은 로비라고 해도 원목마루로 마감한 호텔과 대리석으로 마감한 호텔이 주는 느낌은 천지차이. 최근에는 이런 추세에 따라 바닥재가 바뀌고 있다. 과거 '방과 거실에는 장판, 욕실에는 타일'이 마치 공식처럼 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비닐 소재이지만 목재의 문양과 질감을 한껏 살린 제품이 등장하고 타일 역시 크기와 문양에서 다채로워졌다. 또한 벽돌이 실내 바닥재로 쓰이거나 에폭시로 주거 공간의 바닥을 마감하는 등 새로운 소재를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 쓰이기도 한다.
물에 자주 노출되는 욕실의 바닥재는 대개 타일을 사용한다.

집 안의 장소가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나뉘면서 주거 공간의 바닥재로 다채로워졌다.
그러나 최소한의 원칙과 요건은 있다.
각각의 소재가 가진 고유한 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딱딱한 콘크리트 바탕에 에폭시로 마감한 바닥을 원한다고 해도 어린아이나 노인이 함께 사는 주택 안방의 바닥재로는 적합하지 않다. 공간의 목적,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바닥재를 선택해야 한다.

사용자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부엌에 타일이 쓰이는가 하면 욕실에 목재가 쓰이기도 한다.
공간의 분할과 바닥재의 다양화

한국의 주거 형태가 변하고 발달함에 따라 바닥재의 형태와 소재 또한 다양해졌다.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보편화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한동안 가정집의 바닥재는 노란 비닐 장판이었다. 전통적인 주택의 종이 장판 느낌이 나면서도 저렴해 쓰지 않은 이유가 없었다. 집의 크기가 크지 않고 화장실과 부엌이 주생활 공간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자녀의 방, 부부의 방, 거실 등으로 공간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바닥재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기도 했다. 하지만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집의 크기가 커지고 장소가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집 안의 장소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나뉘게 되었다. 장소의 쓰임새와 개성에 따라 바닥재의 종류 또한 다채로워지기 시작했다.
옛날 전통적인 주택에 사용되던 종이 장판 스타일.
에폭시, 코르크, 카펫 등의 소재는 과거에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바닥재였으나 지금은 곳곳에서 사용된다. 또한 바닥재의 경계가 흐려지며, 사용자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부엌에 타일이 쓰이는가 하면 욕실에 목재가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온돌문화에 따라 바닥난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바닥난방 방식에서는 바닥재의 열효율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두껍고 푹신한 바닥재는 밟았을 때의 느낌이 좋고 넘어졌을 때 충격이 작지만 열효율이 떨어져 모든 장소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한국의 바닥재 종류가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소재나 시공 방법을 개발할 때 열효율이라는 요소가 큰 장벽으로 다가오니 말이다. 반면 입식 생활이 중심이고 바닥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서양은 바닥재를 선택할 때 열효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소재의 제약 없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바닥재는 대개 서구 문화권에서 사용되던 것들이다.
이렇게 서구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이 이제는 한국 문화 속에서 더 다양해 지고 있고, 공간 속 재료 사용도 많은 고민와 연구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바닥을 아우르는 재료에 대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재료 믹스를 통한 사례들을 함께 알아보는 긴 여정을 함께해보자.
바닥재의 다양화와 변해가는 한국 인테리어 문화 속 바닥재료 이야기!
다음 인테리어 재료 이야기에서는,이러한 변화되고 다양해지는 바닥재의 재료별로 분류한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변화되는 인테리어 시장과 공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다양성을 다뤄 줄, 바닥재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재밌고 긴 여정에 초대합니다!
'Interior 인테리어 > Material 재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닥재- '마모륨' 장판, 기후변화에 맞춘 탄소중립 친환경 자재 (0) | 2022.06.22 |
|---|---|
| 원목마루의 장단점! 알고 선택하면 후회없는 인테리어 (0) | 2022.06.02 |